구성원 정서 케어, 단순한 '감정 파악'과는 달라야 합니다!
- argentum92
- 2025년 8월 27일
- 4분 분량
최종 수정일: 2025년 11월 14일

'구성원들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'
'회사에 대한 감정, 팀에 대한 감정, 팀장 및 리더에 대한 감정... 서베이를 분기별/반기별로 하고는 있는데 뭔가 놓치고 있는 거 같아. 정말 이것만으로 될까? 충분한 거 맞나?'
'서베이가 너무 일회성에 그치는 거 같아.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하지?'
조직의 '전체 상태'를 확인해야 하는 위치에선 한 번쯤 던졌을 질문들.
과연 서베이에서 묻는 '감정'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요?
업무 몰입도와 감정 사이에는 정확히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?
정말로 간극이 존재한다면 그 틈은 무엇으로,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?
이번 콘텐츠에서는 위의 세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.
1. 상황이 정서를, 정서가 감정을 만든다.
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,
'감정'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사실 '감정(emotion)'은 느낌의 표현보다는 '이름표'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.
서로간 소통의 편의를 위해 비슷한 느낌을 묶어 붙여 둔, 분류표 같은 단어죠. 이에 비해 '정서(affections)'는 그 감정을 느낄 때의 맥락을 전부 포괄하는 말입니다.
예를 들어 볼까요.
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.
'그대가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제였나요?'
지금 생각해도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,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던 날.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서라도 '저 오늘 이런 일 있었어요!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!' 하며 외치고 싶었던 날.
그 때의 기쁨을, 단순히 '기쁨'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?
이제 다른 질문입니다.
‘그럼 ‘기뻤던’날은 언제였나요?’
'기뻤다'라는, 그 한 단어만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던 또다른 날.
이제 두 날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. '가장 기뻤던 날'. 기쁨 한 단어로는 그저 부족하기만 했던 날. '기뻤다, 좋았다'라는 한 단어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깔끔한 표현이 가능했던 날. 이 둘을 '기쁨'이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묶을 수 있을까요? 과거를 추억하는 입장에서, 그 날들이 같게 취급될 수 있을까요?
바로 이 지점이 감정과 정서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. 감정은 '기쁨'이라는 한 단어, 즉 이름표입니다.
정서는 그 기쁨의 상황 속 맥락까지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. 즉, 정서 = 감정 +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색 팔레트를 한 번 떠올려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.
보라색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?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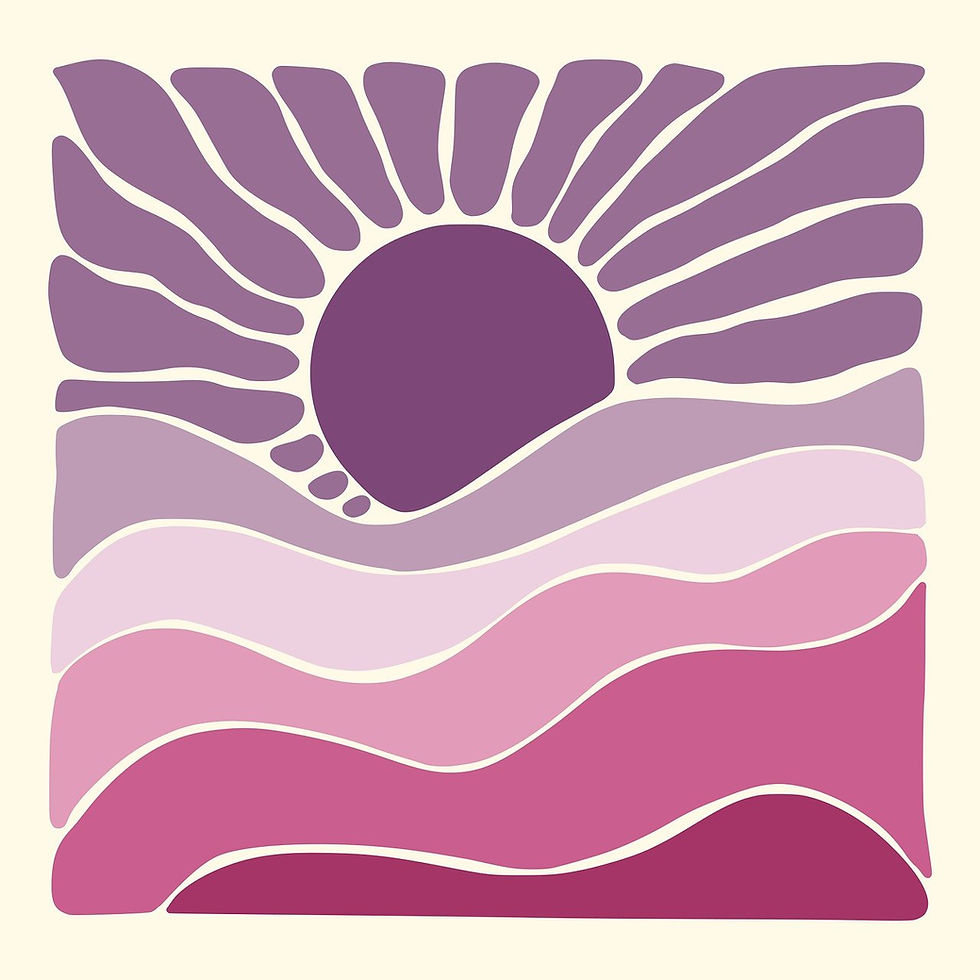
위의 그림처럼, '보라색'이라는 큰 색조 안에도 수많은 종류의 색이 있습니다. 옅은 보라색, 바이올렛, 짙은 보라색, 군청색 등등…
덕분에 같은 범주 안의 색이라도 그때의 분위기와 느낌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'보라색'이라는 큰 틀이 감정이라면, 그 안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정서입니다.
덕분에 둘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.
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줄거리와 함께 달리는 마음이 정서(맥락이 반영된 마음), 이 정서의 스크린샷이 감정(맥락이 없는 단순한 느낌. 기쁨/슬픔/괴로움/아픔/분노).
2. 업무와 정서 간의 상호작용 - 정서가 성과를 만든다
그럼 이 정서와 업무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?
간단합니다.
정서가 곧 성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.
앞서 말씀드렸듯 정서를 이루는 요소에는 '맥락'이 있고,
한 개인의 삶과 업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맥락 안에서 존재하니까요.
이번에도 상황을 한 번 가정해 볼까요. 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전날 잠을 설쳤고, 덕분에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, 버스 환승까지 늦어져 회사 도착 전부터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고 해 보겠습니다. 이 상황에서 해당 구성원의 맥락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?
잠을 설쳤다 -> 휴식이 부족한 상황
아침을 건너뛰었다 -> 에너지도 없음
버스까지 늦게 와서 허겁지겁 출근해야 했다 -> 몸도 잔뜩 긴장한 상태
결과적으로 몸은 아래와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.
"에너지를 더 써서는 안 된다."
"최대한 빨리 에너지원(탄수화물, 당, 염분 등)을 보충해야 한다."
"긴장을 풀고 휴식해야 한다."
그런데 '업무' 라는 녀석의 특성은 어떠하던가요.
먼저 집중이 요구됩니다. (=에너지가 들어가는 활동)
점심 전까지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합니다. (=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없음)
일하는 동안은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(=긴장은 계속 유지됨)
결론은? 명확합니다. 업무 몰입이 애초에 불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회사 직원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니까요. 몸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의 조건만 주어지는 상황. 과연 해당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집중과 몰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설령 몰입이 가능하다 해도 지속력 있게 유지하는 것은요? 만일 이런 풍경이 팀장급 이상, 즉 의사결정권자에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.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몸 상태가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면, 그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.
3. 어떻게 해야 전체를 볼 수 있을까
마지막 셋째,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.
의외로 검증된 방법이 있습니다.
바로 구성원들의 신체 예산을 매일 체크하고, 필요 시 간단한 서베이를 더하는 것입니다.
구성원들의 정서와, 그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. 그들만 짧게 톺아보며 신체 예산을 점검하는 것이죠.
식사는 잘 했는가?
잠을 설치지는 않았는가?
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?
어제오늘 나의 상태를 키워드로 표현하면 어떠한가?
끼니를 챙겼는지, 잠은 잘 잤는지, 몸은 움직였는지... 더해서 어제오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것입니다.
이를 통해 각 구성원의 바디 버젯을 파악하고, 팀장이나 HR 매니저가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이죠.
커피챗이 필요하다면 커피챗을 연결하고,
1:1 면담이 필요하다면 면담을 진행하고,
단순 휴식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업무 일정을 조율해 보는 방향으로요.
그리고 이런 과정을 돕는 툴도 존재합니다.
"그런 게 어디 있느냐"고요? 여기 있습니다. 😊
구성원들의 몸과 마음, 종합하여 신체 예산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요!

참고문헌:
<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>, 리사 펠드먼 배럿 저, 최호영 옮김, 생각연구소
Bakker, A. B., Demerouti, E., & Sanz-Vergel, A. I. (2014). Burnout and work engagement: The JD–R approach.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, 1, 389–411. https://doi.org/10.1146/annurev-orgpsych-031413-091235
Bakker, A. B., Demerouti, E., & Sanz-Vergel, A. (2023). Job demands–resources theory: Ten years later.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, 10, 25–53. https://doi.org/10.1146/annurev-orgpsych-120920-053933
Understanding Your “Body Budget” and How to Manage It
van Eerde, W., & Venus, M. (2018). A daily diary study on sleep quality and procrastination at work: The moderating role of trait self-control. Frontiers in Psychology, 9, Article 2029. https://doi.org/10.3389/fpsyg.2018.02029


